써야 할까. 쓰기는 써야 하는데..쓸 수 없어서 쓰지 못하고 있었다...
몇년 동안 중보기도때마다 제일 먼저 이름을 부르던 분이 수요일 아침에 소천하셨다. 나보다 한 살 많은 두 아이의 엄마이다.
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의 마침표를 찍은 날이리라. '엄마'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모든 이들을 연결하는 마음의 고통도 이제는 그녀를 괴롭히지 못하리라.
그러나 두 아이가 마음에 고스란히 남는다. 엄마를 잃은 딸과 엄마를 잃은 아들이. 다음날 더 아프고 다음 날 더 입을 닫게 된다. 오늘은 그 아이들의 이름도 되뇌이지 못하겠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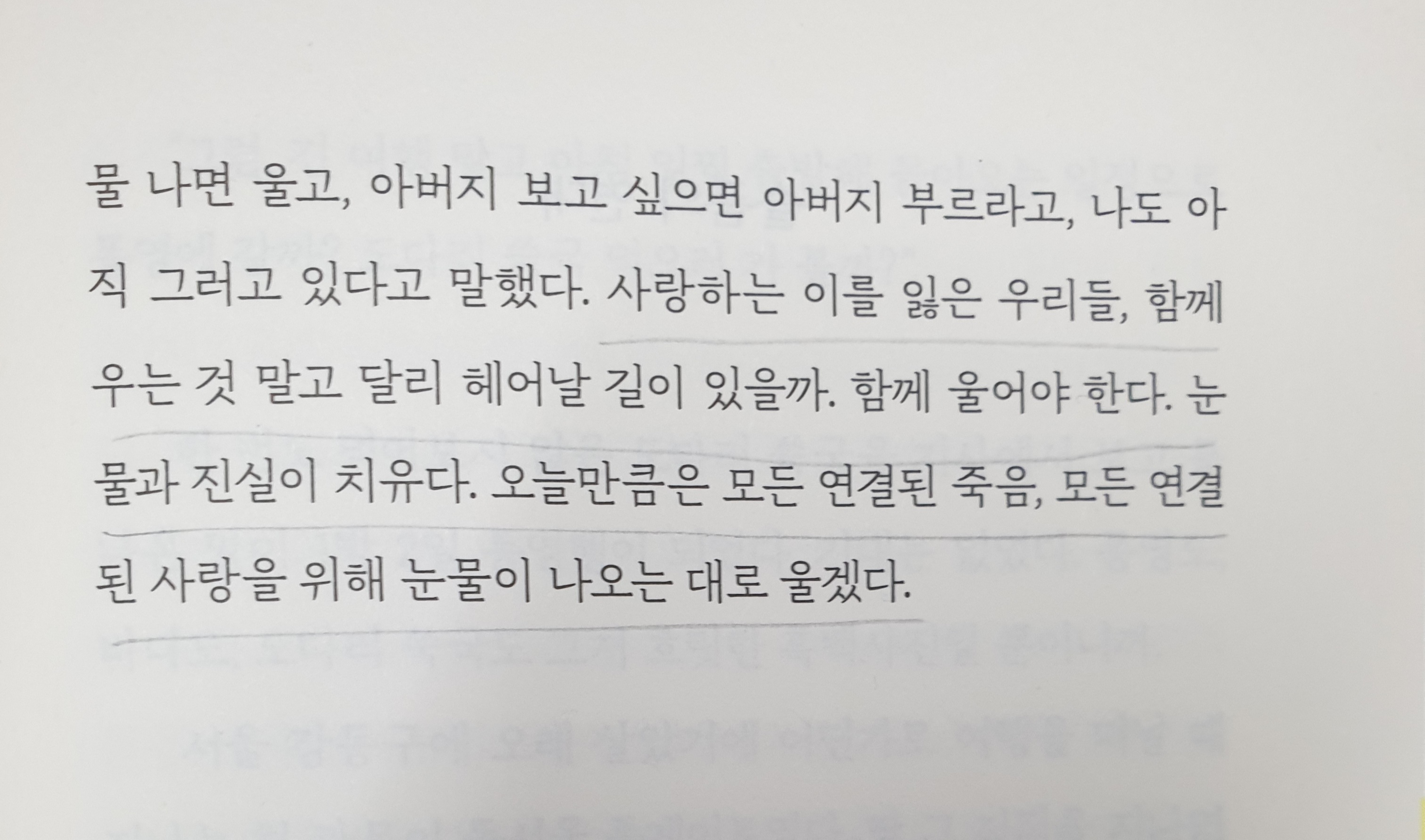
눈물과 진실의 치유를 간절히 바라며 떼어지지 않는 입술을 움직여야 한다. 그리고 애도해야 한다. 가야 할 길을 보았으니...
'시내가 흐르게 하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구구구 (0) | 2021.12.09 |
|---|---|
| 조각배 (0) | 2021.08.12 |
| 어떻게 하면 전달 할 수 있을까? (0) | 2021.06.28 |
| 전문가의 손길을 잘라내다. (0) | 2021.06.10 |
| 시작했더니. (0) | 2021.05.22 |

